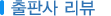
1. 한국시단의 독특하고 경쾌한 상상력, 황인숙 시인의 자선 대표시집!
『꽃사과 꽃이 피었다』는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가 당선되면서 시단에 데뷔했고, 동서문학상(1999)과 김수영문학상(2004) 등을 수상한 황인숙의 첫 시선집이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30년간 황인숙 시인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시집들에 수록된 시들 중 시인이 가려 뽑은 시선집 『꽃사과 꽃이 피었다』에는 발랄하고 경쾌한 상상력을 통해 사물에 아름다움을 불어넣어주는 황인숙 시인 특유의 깔깔거림과 쓸쓸함의 시어들로 가득 넘친다. 시인은 일상과 사물에 부여된 낡은 옷과 생각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며 답답한 현실을 새로움의 충동으로 만들어놓는다. 그리하여 시인의 통통 튀는 개성적인 문체와 시크한 사유를 통해 부조리한 생의 허무를 부드럽게 매만진다. 마치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한 그의 시편들은 ‘생’이라는 부조리극에 대한 조롱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휘파람이기도 하다.
세상살이의 복잡함과 무모함에 초연하면서 그래도 살아가야만 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황인숙 시인은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때론 조심스럽게 때론 오만하게 행간과 행간을 내딛으며 생의 ‘자명한’ 이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전도적 상상력(오규원),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의 대립(김현), 독특한 탄력과 비상의 언어(정과리),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고통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사랑의 방식(김진수)으로 설명돼온 황인숙의 시세계는 이번 시선집을 통해 가벼움의 미학이 깊고 투명한 의미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준다.
2. 고양이를 부탁해
황인숙 시인은 오래 전부터 집 근처의 버려진 길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 지금도 “란아, 복고, 명랑” 세 마리의 길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시인은 1988년에 펴낸 첫시집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와 2007년에 펴낸 시집 『리스본행 야간열차』에서 고양이에 대한 애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가시덤불 속을 누벼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낟가리를 찾으리라.(『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부분)
그건 동트기 전이었지
우연히 나는 보았지
두 지붕 너머 긴 담...
『꽃사과 꽃이 피었다』는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가 당선되면서 시단에 데뷔했고, 동서문학상(1999)과 김수영문학상(2004) 등을 수상한 황인숙의 첫 시선집이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30년간 황인숙 시인이 문학과 지성사에서 펴낸 시집들에 수록된 시들 중 시인이 가려 뽑은 시선집 『꽃사과 꽃이 피었다』에는 발랄하고 경쾌한 상상력을 통해 사물에 아름다움을 불어넣어주는 황인숙 시인 특유의 깔깔거림과 쓸쓸함의 시어들로 가득 넘친다. 시인은 일상과 사물에 부여된 낡은 옷과 생각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며 답답한 현실을 새로움의 충동으로 만들어놓는다. 그리하여 시인의 통통 튀는 개성적인 문체와 시크한 사유를 통해 부조리한 생의 허무를 부드럽게 매만진다. 마치 콧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한 그의 시편들은 ‘생’이라는 부조리극에 대한 조롱이자 자유로운 영혼의 휘파람이기도 하다.
세상살이의 복잡함과 무모함에 초연하면서 그래도 살아가야만 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황인숙 시인은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때론 조심스럽게 때론 오만하게 행간과 행간을 내딛으며 생의 ‘자명한’ 이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전도적 상상력(오규원),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의 대립(김현), 독특한 탄력과 비상의 언어(정과리), 고통을 껴안음으로써 고통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사랑의 방식(김진수)으로 설명돼온 황인숙의 시세계는 이번 시선집을 통해 가벼움의 미학이 깊고 투명한 의미로 확산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준다.
3. 발랄함과 경쾌함의 아이콘 황인숙―현실의 남루함을 싱싱하게 변주하다
오랫동안 황인숙의 시들은 발랄함과 경쾌함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를테면 “벌판을 뒤흔드는/ 저 바람 속에 뛰어들면/ 가슴 위까지 치솟아 오르네/ 스커트 자락의 상쾌!”(바람부는 날이면)와 같은 시에서 느껴지는 경쾌하게 솟구치는 희열감 같은 것 말이다. 황인숙의 시에서 이러한 희열감은 종종 시인의 몸, 혹은 사물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약동하는 소리들을 수반한다.
시인은 무엇보다 말을 통해 세상을 꿈꾸고 노래하는 사람이다. 바늘 끝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취할 수 있는 쾌락을 찾아 헤매는 시인은 불감증에 빠진 세상뿐만 아니라 불감증에 빠진 말과도 관능적인 사랑의 순간을 꿈꾼다.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기분 좋은 말을 소리내보자.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얼음. 바람. 아아아.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비!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느낌표를 밟아보자.
느낌표들을 밟아보자. 만져보자, 핥아보자.
깨물어보자. 맞아보자. 터뜨려보자! (『말의 힘』 전문)
이 시에서 시인에게 말은 더 이상 의미의 그릇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그릇이고 감각의 그릇이다. 마음속에 떠올리는 순간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생생한 감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말들. 시인이 꿈꾸는 것은 바로 그런 말들이다. 이를테면 “비!”라는 말을 소리내서 발음해보라! 순간 우리 영혼을 기분 좋은 느낌표로 가득 채워주는 것은 말의 의미가 아닌 말의 순수한 어감, 혹은 존재감이 아닌가? 다음의 시 역시도 대상 속으로 스미고 싶은 시인의 열렬한 사랑의 외침을 들려준다.
나는 신나게 날아가.
유리창을 열어둬.
네 이마에 부딪힐 거야.
네 눈썹에 부딪힐 거야.
너를 흠뻑 적실 거야.
유리창을 열어둬.
비가 온다구!
비가 온다구!
나의 소중한 이여.
나의 침울한, 소중한 이여. (『나의 침울한, 소중한 이』)
시인은 이 시에서 “비!”라고 말하는 대신, 스스로 “날개 달린 빗방울이 되”어 너에게로 스며들려 한다. 시인은 너를 향해 “유리창을 열어둬”라고 외치며 빗방울처럼 신나게 날아가 너와 나를 가로막는 유리창을 넘어 너의 이마를, 눈썹을 흠뻑 적시고자 한다. “네게 말할 게 생겨서 기뻐. 비가 온다구!”라는 그 들뜬 외침이 서로에게 스며들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세계.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창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야생의 고양이를 꿈꾸던 세계에서 버려진 고양이의 고적한 운명과 대면해야 하는 현실 속으로 되돌아온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너무나 자명한 세계의 모습이 아닐까?
4. 자명한 세계로의 산책
황인숙만의 시어가 지닌 특유의 경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녀의 시에서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사실 자명한 세계의 모습이다. 잠들어 있는 세계의 사물들을 텅텅 두드리며 약동하는 호흡을 뿜어내던 시인은 이제 모든 게 자명해진 세계의 산책자가 된다. 시인의 그 산책길을 따라가 보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금빛 넘치는 금빛 낙엽들
햇살 속에서 그 거죽이
살랑거리며 말라가는
금빛 낙엽들을 거침없이
즈려도 밟고 차며 걷는다 (『자명한 산책』 부분)
시인은 금빛 낙엽이 깔린 단단한 보도블록 위를 걷는다. 그 길은 어디에 독충이나 웅덩이라도 숨겨두고 있지 않을까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명한 길이다. 찬란한 금빛을 뿜어내는 낙엽들은 지천에 깔려 있어 누구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누구도 소유하려 들지 않기에 무심히 버려져 있는 낙엽들은 금빛을 잃고 점차 거죽이 말라들어간다. 시인은 생의 긴장과 생기를 잃어버린 그 길에서 “자명함을 퍽! 퍽! 걷어차며 걷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고작 이것뿐이라는 듯. 시인은 자신의 방에서도 자명한 세상과 조우한다. 책상서랍에서, 벽에서, 화장대에서 그녀는 “더 이상 볼펜이 아닌 볼펜/ 더 이상 달력이 아닌 달력/ 더 이상 편지가 아닌 편지/ 더 이상 건전지가 아닌/ 건전지”(?더 이상 세계가 없는?)와 만나고 “더 이상 향기가 아닌 향기를 풍기며/ 목까지 죽이 되어/ 그러나 얼굴은 극단의 건조를 보이”는 병 속의 꽃들을 본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뿌옇게 버캐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방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영정처럼 낯설게 바라본다.
황인숙 시인의 시편들은 ‘긴장된 리듬감’을 타고 ‘발랄함으로 승화’(고종석)하여 황인숙만이 빚어낼 수 있는 상상력으로 현실의 남루함을 싱싱하게 꽃피운다. 이번 시선집 『꽃사과 꽃이 피었다』를 통해 독자들은 삶의 희비에 발 묶이지 않고 가벼이 산책하며 속삭이는 황인숙 시인의 자유롭고 맑은 허밍(humming)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막사발/이남순 (0) | 2021.12.25 |
|---|---|
| 컵/조경선 (0) | 2021.12.24 |
| 사람 지나간 발자국/이경림 (0) | 2021.12.19 |
|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피재현 (0) | 2021.12.19 |
| 가을 손/이상범 (0) | 2021.12.17 |
